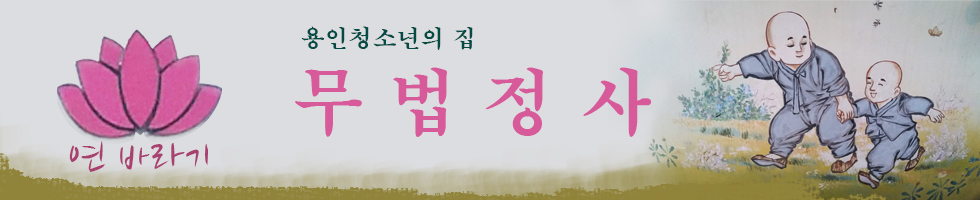|
종승은 자존심이 대단한 승려였다.
스승인 보리달마이외엔 누구도 자기의 웃길에 들지 못한다고 말해 온 터였다.
그런 그가 도견왕에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으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는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생각했다.
내 나이가 지금 100살, 20년 전인 80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큰소리 치던 내가 아니었던가.
지난 20년 동안은 다행히 보리달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정진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해도 본분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런 내가 불교를 부정하고 불법을 폐하려는 도견왕에게 꼼짝도 못했으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이제 ‘나’라는 존재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무슨 면목으로 스승인 보리달마를 대한단 말인가.
종승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바위 위로 올라갔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었고 바람이 회오리쳤다.
절벽 아래는 안개가 휘감겨 밑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종승은 날씨조차도 전생의 억겁이라고 생각했다.
침통한 표정의 얼굴은 차츰 창백하게 변해 갔다.
이윽고 표정에 나타나던 마음의 굴절도 사라지고, 차츰 평안과 고요를 찾은 듯 싶었다.
종승은 감았던 눈을 떴다.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곤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종승이 눈을 떠 보니 두껍게 이끼가 낀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신선같이 생긴 도인이 미소지으며 서 있었다.
어떤 곡절인지는 모르지만 이 도인이 목숨을 구해 준 것이라 짐작했다.
종승은 몸을 일으켜 합장하며 도인에게 말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내가 구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대가 죽지 않은 것일세.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듯 싶으이.
몸을 던졌으나 그대의 옷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이렇게 이끼 낀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 어찌 죽을 수가 있겠는가. 잠시 기절한 것을 내가 돌봐 준 것일 뿐이네.
한데 그대는 지극한 나이에 왜 그토록 목숨을 버리려고 했는가?”
종승은 자신도 모르게 감동의 열기로 온 몸이 뜨거워 옴을 느꼈다.
“저희 사문(沙門)에 있는 자는 마땅히 법을 바르게 하는 것을 첫째의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도견왕이 삼보를 훼손하고 불도를 폐하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버려 책임을 져야 하거늘 도인께서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승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들려 줄 게송 하나가 있네. 게송을 들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네.”
“원컨대 도인께서는 어리석은 저를 깨우쳐 주시고 남은 삶을 지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신인은 종승에게 한 구절씩 또박또박 게송을 읊어 주었다.
“그대 나이 이미 100살에 이르렀으나 80년 동안은 잘못을 저질렀도다.
부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과 마음 닦아 입도(入道)했도다.
비록 조그만 지혜 갖추었지만 너와 나를 가리는 일 또한 많구나.
만나 본 여러 현인들에게 이제껏 참다운 존경심을 가져 본 일이 없도다.
20년 쌓은 공덕인데 마음은 아직도 맑아지지 않았구나.
총명이 가볍고 자만한 까닭에 오늘 여기에 이르렀도다.
왕을 만나고도 불경(不敬)했으니 이런 결과가 온 것은 당연하구나.
이제부터라도 소홀하고 나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지혜 얻으리라.
모든 성인들은 한결같이 마음 속에 있고, 여래 역시 네 속에 있음을 알지어다.”
게송을 다 읊고 나자 도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며시 사라졌다.
엎드려 듣고 있던 종승은 그것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은 채 합장의 예를 올렸다.
종승은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다.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정적이 그를 에워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