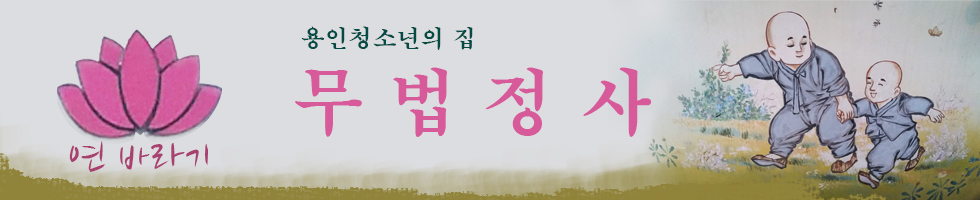|
보리다라는 몸을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낯익은 얼굴의 여인이 위를 올려다보면서 향긋한 미소를 뿜고 있었다. 순간 보리다라는 할 말을 잊었다.
여인의 흰 비단 치맛자락은 천의(天衣)인 양 하늘거렸고, 초생달 같은 눈매에 발그레한
뺨은 옥으로 빚은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조용한 목소리로 보리다라를 향해 간단한 인사를 건넸다.
“사형! 일찍 일어 나셨네요? 수련하셨나 보죠.”
보리다라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이 여인으로 말하자면 보리다라와 한 스승 밑에서 무술을 배우는 사매(師妹) 막의(莫依)였다.
그는 막의가 웃음을 보내는 속뜻을 알았다.
그는 구름을 밟고 바람을 타는 비술을 부린 것을 후회했다.
그런 비술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보리다라가 지닌 원래의 공력만으로도 천상석에 날아오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다.
보리다라는 단지 수련의 피로를 덜기 위해 비술을 썼을 뿐이다.
하지만 선문(禪門)의 수련에서는 그런 편법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보리다라는 할 말이 없었다.
몸을 돌려 천상석 위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두 손을 합장하고 두 눈을 지긋이 감았다.
호흡을 조용히 가다듬으며 좌선을 시작했다.
막의의 웃음소리가 뚝 멈췄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순간,
보리다라의 귓가에 한줄기 바람 기운이 스친다.
살짝 눈을 떠보니 막의가 눈앞에 내려앉는 참이었다.
총기어린 눈동자를 굴리면서 막의는 우스워 죽겠다는 표정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보리다라는 온 몸이 달아올랐다.
또 한번의 실수를 뼈아프게 후회했다. 본래 좌선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매 앞에서 짐짓 좌선하는 척 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본래 좌선은 고요히 관(觀)하는 것이다.
관이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내면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고요함은 선천적인 지혜에 접근하는 온상이라고 일컬어진다.
지혜는 고요함의 궁극에서
나타나는 얼빛이다.
그러므로 불가의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도 고요함 즉 선정(禪定)을 중심으로 반야를
이루어가는 닦음인 것이다.
일찍이 노자(老子)는 비어 있음을 철저히 정관(靜觀)하고, 고요함을 착실하게 지키면 만물이
함께 번성하되 그 돌아감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본래의 자리 곧 뿌리로 돌아옴을 일컬어 존재의 운명으로 돌아감이라고 했다.
존재의 운명으로 돌아감을 일컬어 실재라고 했고, 실재를 아는 것을 일러 깨달은 밝음이라고 했다.
증자(曾子)는 대학(大學)을 저술할 때 이 점을 보다 명백히 밝혔다.
그치는 것(止)을 안 다음에야 정(定)이 있고,
정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 다음에 편안함이 있고,
편안함에 이어 깊은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런 생각의 연후에야 능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견해는 한마디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좌선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조금이라도 고요함이 흔들린다면 수련자의 생각은 헷갈리기 십상이고 마음은 어지러워지게
마련이다.
이런 상태에선 참된 수련이란 불가능하다.
보리다라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막의의 얼굴에 나타난 웃음은 한순간에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웃는 모습에서 그는 은근히 모멸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외면하기 힘든 야릇한 기운이 있었다.
비록 열 여덟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사매지만 보리다라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엄격했다.
그의 결점을 서슴없이 들춰내는가 하면 어떤 일에서도 양보는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싶지 않았다. 벌떡 일어서서 막의를 향해 정중하게 합장의
예를 했다.
“사매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리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면서도 그녀는 생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소한 실수에 지나지 않은 걸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은 것 같군요. 용서해 주세요, 사형.”
그래도 보리다라는 여전히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몰랐다.
눈치 빠른 막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만한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사형께서 할 일은 휴식인 것 같아요.
어서 절로 돌아가세요.”
사매의 말투는 늘 이랬다.
탈이라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솔직 담백한 것이었다.
보리다라는 이런 막의의 진심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사형, 내일 아침에 우리 함께 수련하는 게 어때요?”
“…”
보리다라는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얼굴에 씁쓸한 미소만 지을 따름이었다.
|